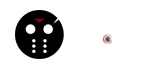일본 평론가,감독이 말하는 일본영화계의 한계
 golgo
golgo
fuzoo111님이 링크해주신 글에...
<기생충>과 비교해서 일본영화 제작 현장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부분만 발췌해 옮겨봤습니다.
https://extmovie.com/movietalk/54048625
원문은 아래고요.
https://miyearnzzlabo.com/archives/62625
마치야마 토모히로 – 일본의 유명 평론가. 한국계 혼혈임.
쿠도 칸쿠로: 일본의 유명 각본가 겸 감독. 봉준호 감독의 팬으로 <설국열차> 때 대담을 한 적 있음 (https://extmovie.com/movietalk/3619762 )

(한국, 일본 영화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치야마: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중략) 일본에서도 지방의 가난한 지역과 우아하게 사는 사람의 비교를 다루는 것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선 “그럼 그런 영화에 누가 돈을 내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경우 제작비가 12억 엔(약 130억 원)이에요.
쿠도: 그렇다고 하죠! 굉장해요. 제작비가 말이죠. 광고비가 포함되지 않은 현장의 제작비가 말이죠.
마치야마: 예, 그래서 순 제작비가 12억 엔. 일본에선 그 <킹덤>의 제작비가 10억 엔이죠. 그런 <킹덤>이 초초초대작이란 말이죠. 일본영화의 레벨에서 보면요.
쿠도: 그래, 맞아요!

일본영화계의 초대작이라는 <킹덤>(동명 만화 원작 액션 사극)
마치야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일본은 영화가 흥행해 히트하는 상한이 대체로 30억 엔(약 323억 원) 정도로 보죠?
쿠도: 뭐, 잘 벌었다고 할 금액이라고 할까. 본전을 회수하고서, ‘굉장해!’라고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마치야마: 그렇죠. 대규모 개봉을 했을 때 대체로 30억 엔이죠. 그래서 30억 이라는 기준에서 제작비라는 것을 역산해보면, (제작비가) 10억 엔이 되죠. 대체로 원가가 1/3로 나오죠. 그래서 제작비 10억 엔이라는 게 일본영화 대작의 한계예요. 그 이상의 제작비를 들이면 회수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쿠도: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마치야마: 그래서 30억이라는 건 ‘대히트’니까. 그럼 ‘그럭저럭 히트’로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의 제작비가 일반적이냐고 한다면 5억 엔(약 54억 원) 정도죠. 독립 영화 쪽으로 가보면 그보다 더 내려가서 3억이나 1억이 되면서 점점 내려가는 식이죠.
쿠도: 게다가 (한국영화는) 촬영 기간을 반년 정도 가진다죠.
마치야마: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기생충>은 전부 세트로 찍었대요.
쿠도: 맞아요. 맞아. 그렇게 들었어요.
아나운서 코사카 리카: 예? 그게 세트라고요?
마치야마: 전부 만든 거예요.
쿠도: 부잣집도, 가난한 집도, 거리도 만든 거래요.
마치야마: 현재 일본영화계에선 세트를 못 만들어요. 예전에는 촬영소가 있어서 세트를 크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일본은 조그마한 세트 정도밖에 못 만들죠.
코사카: 와! 그게 세트였다니!
쿠도: 돈... 말씀하신 대로죠. 아마도 세트에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죠.
마치야마: 그렇죠. 그리고 비라는 요소가 있죠. <기생충>에는 비가 엄청 내리는 장면이 많잖아요.
쿠도: 인상적이죠.
마치야마: 일본영화에서 “비를 내리게 해줘”라고 말하면 프로듀서가 투덜거리면서 안 된다고 말하죠.
쿠도: “정말로 필요해요?”라고 말이죠. (웃음)
마치야마: 맞아요. (웃음) “정말로 필요하냐?”고. (웃음)
쿠도: “여기서 꼭 비를 내려야만 하는 건가요?”라고 말하겠죠.
코사카: 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마치야마: 돈이 들기 때문에 비를 싫어하죠.
쿠도: “정말로 비 내리는 날씨면 굳이 꼭 안 내리게 해도 되잖아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실제로 내리는 비는 사실 (카메라에) 찍히질 않아요.
코사카: 아니, 그런 건가요?
쿠도: 대량으로 비를 뿌리지 않으면 화면에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라는 것은 거의 100%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마치야마: (비를 내리게 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선 비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인공들의 감정이 고조될 때 비가 내리죠. 살인이 벌어지는 순간이라든가, 괴수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일본영화에선 좀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코사카: <살인의 추억>에서도 비가 굉장히 내렸었죠?
쿠도: 그 영화에선 비가 내리면 살인이 벌어지니까요.
마치야마: 역시나 돈이 문제죠. (일본에) 퀄리티가 무척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도 그걸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아 복잡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웃음)
코사카: 쿠도 씨가. (웃음)
쿠도: 맞아요. 말씀하신대로죠.
마치야마: (일본) 시장의 규모가 작게 형성돼 있고, 해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쿠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golgo
golgo
추천인 22
댓글 46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2등
2등 때깔은 또 괜찮았었던.. 영화로 돈벌 생각을 아예 안하나봐요.
 3등
3등 왜 《기생충》의 외형만을 보려 할까요?
모든 일본 감독들이 구로사와 아키라처럼 영화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은 한국의 사회적인 맥락이 가장 큰데...
당신들도 황금종려상 받았지만 정부에서 내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왜 인정 받았는데...



일본 관객들의 선호도가 전세계에서도 유니크할정도로 독특해서
헐리웃 블럭버스터가 아닌 이상
일반 상업영화는 크게 히트하기 어려운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대로 큰제작비를 투자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감독들에대한 대우도 박하다보니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없어 보이네요



기생충 자체가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인 작품도 전혀 아니고... 그정도의 돈을 들여 과감하게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작이 나올 수 있었구나, 식의 대화같아서 갸우뚱하게 되네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영화를 많이 소비 안하나봐요
영화가 흥행해 히트하는 상한이 대체로 30억 엔이라니 헐



전 그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고, 잔잔한 일본 영화도 B급 만화적 감성의 영화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어쨌건, 일본 영화 산업 환경에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냥 자기네들에게 강점인 영화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전 고전 영화들 중에서도 괜찮은 작품들도 많았건만...

http://shingeki-kyojin.com/archives/45569229.html
진격의 거인의 1편당 제작비는 대략 18억 엔 정도고.. 두편 합쳐서 36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3277만 달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7500만 달러는 아닌 것 같네요.
특히 위 글에서 이야기하는 평론가 마치야마 토모히로가 <진격의 거인> 각본가로도 참여했다고 하니, 저 사람 발언이 영 틀린 건 아니겠죠.

http://www.junk-weed.site/entry/2018/09/15/170016
맞아요. 참 일본의 모든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답답함이네요. 해외를 노리고있지 않는다던가 이런말은 대체 웬 핑계인지.. 한국영화도 해외를 노리고 만드는게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든 국내에서 성공하고 주목받으려고 애쓰는데..? 케이팝에 이어 한국영화도 이런식으로 왜곡을 시키는군요.. 한국시장에서 도태되면 해외시장까지 갈 것도 없이 자연도태인데 말이죠.
돈도 요즘이야 시장이 커지고 투자도 커졌으니 100억 대작도 연 몇편씩 배급사마다 나오는 수준이지, 보통은 텐트폴 아닌 이상 그정도 규모로 투자하는 영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해외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서 한국영화가 발전했다는건.. 영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작자의 뜻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꾀하는 CJ의 전략이라든지, 영진위 지원 등을 크게 확대해석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인들에겐 그런 게 커보이는 건지..


https://extmovie.com/movietalk/54053146



애니도 돈 벌어봤자, 애니 감독보다는 그 애니 원작자(만화, 소설, 출판사)가 떼돈 번다던데 신카이는 원작자이기도 하니까요.



돈적인 문제만은 아닌듯. 사회적으로 영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은 많이 다른듯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 영화 제작비는 한국 영화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서 천문학적이란 표현을 하는 작품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셋트 이야기하지만 90년대만 해도 쇼지쿠나 토호 스튜디오의 셋트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간걸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것이지요.
이게 단순히 투자와 제작 여건의 문제일까요?
일본인들의 폐쇄성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장인정신 좋은 것이지만 시대에 뒤떯어진지 오래죠. 빨리 빨리 나쁘다고 했지만 새로운 기류에 빨리 올라타고 적응하는 한국의 큰 장점이 되었잖아요.
결국 일본인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고 옛 영광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봅니다.
사람이 변해야 영화도 변하는 것이겠지요.


세트라는데서 놀라는군요
팩트로 말하면 인구대비 영화시장은 우리가 더 큽니다 영화를 보는 인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아요 멀티플렉스
영향도 있겠지만 영화보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일본은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매 하고 끝 근데 일본은 일단
영화표 예매하면 2 만원 정도 할거에요 거기다 팜플렛도 돈주고 사야하고요 거기다 극장에 가서 봐야하는 영화들이 어떤분들 말처럼
애들 코스프레 하는 영화들인데 사람들이 극장에 안가죠 어쩌다 100 억을 들인다고 해서 꼭 해외 시장을 바라본다 ? 내수시장도
단단하고 해외시장도 바라보고 두가지 효과가 있겠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보고 한국은 해외시장이 아니면 안된다는식으로
접근하는 저들 방식이 안타깝네요 국책 , 해외시장 딱 이 두가지 그냥 단순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어느나라나 공통적이에요
각본이 좋고 , 연기가 좋고 재밌으면 사람들이 돈주고 극장가서 보는거에요 그리고 평가는 뒤따라 오는거고요
근데 국책이 어쩌고 등등 고레에다 히로카즈 , 구로사와 기요시 등등 지금도 일본에는 능력있는 감독님들
또 일본만이 할수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배우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다른곳에서 헛다리 집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