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스포)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스콜세지
스콜세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연출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인간의 평범성과 동시에 잔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근무하는 독일 장교 루돌프(크리스티안 프리델)는 수용소 바로 옆 벽 하나를 두고 엄청난 정원과 수영장을 갖고 있는 집에 아내 헤트비히(잔드라 휠러)와 다섯 아이와 함께 삽니다.
너무나 평온해보이고 행복한 이 가족은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죽는지는 일체 관심이 없는 채 정원의 꽃을 걱정하고 루돌프의 생일선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돌프는 전출 명령을 받게 되고 3년 동안 피땀(?)흘려 집을 가꾼 아내 헤트비히는 자신과 아이들을 두고 남편 혼자 전출을 가라고 말합니다.
올해 아카데미 국제장편상과 깐느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여전히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20세기의 비극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물론 수용소 바로 옆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 만큼 당시의 나치와 그에 동조하는 가족들의 잔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포는 또한 평범함에서 나오는지도 함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을 두고 말한 <악의 평범성>과 더불어 나치에 대한 묘사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작품은 평화로운 집과 가족에 대비되는 충격적인 사운드가 공포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영화 안에서도 헤트비히의 친엄마가 수용소의 진실을 모른 채 딸의 집을 방문했다가 공포에 떨며 딸에게 메시지도 없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관객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가 유독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집과 수용소를 대비되게 보여주는 트래킹 쇼트와 더불어 2층집 내부를 각기 다른 렌즈로 담아내는 촬영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 이후 이렇게 인상적인 트래킹 쇼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충격적인 사운드와 함께 제공되는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작년 깐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추락의 해부>와 함께 같은 해에 1,2등 상을 받은 작품에 동시에 주연으로 연기한 잔드라 휠러는 <추락의 해부>와는 또 다른 연기를 보여줍니다. <토니 에드만>를 통해 처음 만났던 잔드라 휠러는 이제 대세 배우로서 손색없는 연기를 이 작품에서도 보여줍니다. 특히 옆에서 벌어지는 살인에 꿈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일군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욕망에 찬 여성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10년 전 <언더 더 스킨>의 충격적인 엔딩이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다음 작품이 과연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 보여준 훌륭한 연설처럼 그 생각을 온전히 가진 조나단 글레이저의 차기작은 좀 더 이른 시간에 보고 싶습니다.
추천인 4
댓글 5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2등
2등 관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연출했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적으로 영화 감상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하긴 힘들었네요.

리뷰 잘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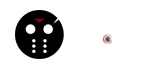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잔드라 휠러가 현재 독일을 대표하는 국제 스타로 확실히 자리를 굳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