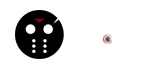글래디에이터 (2024) 비난 받을 만한 영화. 스포일러 있음.
때깔 좋다. 리들리 스콧감독의 영화가 늘 그렇듯이.
하지만, 영화가 기본적으로 너무 이상하다.
아프리카 자유도시 누미디아에서 자유인으로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던
하노라는 남자가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 검투사가 되는 이야기다.
내가 싫어하는 "출생의 비밀"이 바로 이 영화의 주요 소재다. 사실 이 남자가
글래디에이터 1의 주인공 막시무스의 아들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손자였다는
억지스러운 설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가 돌아간다.
"서대문구에서 소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김씨가 사실은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왕의 손자이자 후계자였습니다"하는 수준의 설정이다.
심지어 하노는 자기가 황제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슨, 사실은 기억을 잃었었다 하는 설정도 아니다.)
그런데도, 로마와 연락을 취한다든가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자기가 황제의 후계자이고, 자기 어머니 공주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프리카 시골에서 닭을 키우며 전원일기를 찍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사람이 로마에 검투사로 가자 캐릭터를 싹 바꿔서,
"놀랬어? 내가 아우렐리우스황제의 외손자야. 이제 다 내꺼야!"하고 방방 뛰어다닌다.
캐릭터의 일관성 그리고 개연성같은 것은 감독 머릿속에도 두지 않은 연출이다.
거기에다가 아프리카 누미디아에서 잡혀 온 노예를,
"척 보면 압니다"하는 식으로 어찌어찌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공주 -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보면 알아본다"하는 말 한마디로 퉁친다.
검투사들은 모두 나라를 멸망당하고 로마로 잡혀온 포로들이다. 로마에 대한 원한에 이를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노가 "지금 로마는 썩었다. 외할아버지 아우렐리우스의 꿈인 제대로 된 로마를 세우자"하니까
다들 환호하며 일어선다. 아니, 방금 전까지 로마에 대한 원한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로마를 다시 세우자는 데 왜 환호하면서 목숨을 거는가? 그거, 어차피 너희들 나라도 아니잖아?
일제시대 때 "제대로 된 대일본제국을 세우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호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동참한다
하는 격이다. 영화의 주제가 뭔지조차 갈팡질팡이다. 영화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일관성조차 없다.
그리고, 엄청난 안티클라이맥스가 나온다. 허탈한 안티클라이맥스다.
황제의 군대 육천명과 하노를 지지하는 로마군 오천명이 각각 진군해서 서로 창끝을 마주하고 선다.
이제 전투가 벌어질 일촉즉발의 사건이다.
관객들은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기대한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들을 대치하게 해 놓고, 하노는 악역 댄젤 워싱턴에게
"우리끼리 결투해서 결판을 내자"하고 개싸움을 벌인다.
이럴 거면 일만일천명 군대들을 왜 벌판에 갖다놓고 창끝을 마주하게 해 놓았나?
이 군대들은 그냥 병풍이고, 할아버지 댄젤 워싱턴과 젊은이 하노가 개싸움을 벌인다.
할아버지가 당연히 실컷 얻어맞고 끔살을 당한다. 그러자, 방금전까지 살벌했던 군인들은 얼싸안고
"우리는 하나"를 외친다. 군대가 서로 돌이라도 하나 던졌더라면, 이렇게 허탈하진 않았다.
CF출신감독이라서 영화 때깔은 좋고, 영상을 통해서 감정을 자아낼 줄 안다.
하지만, 때깔에 치중한 나머지 내용이 공허하다 같은 비난을 커리어 내내 받아온 감독이 리들리 스콧감독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징검다리라고 했다. 좋은 영화 - 공허한 영화 - 좋은 영화 이런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