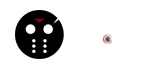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시빌 워] 분열은 총알보다 깊게 박힌다
 창민쓰
창민쓰

CGV 왕십리에서 진행된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시사회를 다녀왔다. 이화정 영화평론가 님과 조승연 작가 님의 GV도 있어서 좋았다. 가랜드 감독의 <엑스 마키나>를 정말 재밌게 본 지라 꽤 많이 기댈했는데 생각보다 쫄깃하고 스릴 넘치는 영화는 아니었다. 다만 시류에 딱 맞는 이야기라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았다. 알고리즘으로 갈라치기가 고도화되는 분열 2.0 시대(없는 말인데 편의상 지음), 중립의 존립 가능성, 기자의 직업윤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스포 있음
1. 위험한 갈라치기 사회. '분열 2.0'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분열은 붕괴의 첫단추이다. 왜놈들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왜란을 일으켰다. 링컨은 정치 초기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다"고 연설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분열의 극단을 운명적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엄연히 따지면 분열하는 것(능동)과 분단된 것(수동)은 다른 거지만 결과적으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북 이념이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다.
분열은 총알보다 깊게 박힌다. 깊고 잔혹하게, 또 오래.. 분열은 한 개인의 사안이 아니다. 우리를 절단하고 가르는 고통이다. 알고리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더 촉진·가속화되고 있다.
영화 '시빌 워'는 종군기자들의 전시 로드 무비이다. 주인공인 그들은 갈라쳐진 세태를 기자의 시선으로 포착한다. 그들은 실제 세상과 달리, 편 먹기엔 관심 없고 건조히 상황 포착에만 관심 있다. 요즘 말로 중립기어 박는 것.
2. 중립은 존립 가능한가?
양쪽으로 나뉘어진 세태를 중앙에서 바라보는 기자들. 헌데 누군가 그들에게 총구 들이밀고 "너는 어느 쪽이야?" 묻는 순간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방향(편)을 선택해야 한다. 다행히도 그런 드라마로 전개되지 않았지만 제시 플레먼스가 등장했던 신에서 이미 그들은 희생되었다. '편' 들지 못해서.
괜히 사람들이 중립을 외줄타기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나. 그만큼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맨 오른쪽에서 보는 중앙, 맨 왼쪽에서 보는 중앙은 그 위치가 다를 테니까.
3. 기자의 직업윤리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올바른 직업윤리인가?
기자에게 중립은 직업윤리인가, 외면인가?
또, 정말 중립이 가능한가?
본인은 가능하대도 양 측에겐 중앙이 아닌, 그래서 사살당하는, 사실상 존재 불가능하진 않는가?
(기타 생각)
- 초중반에 사람 한 명이 총에 맞아 죽는데 동시에 힙합 음악이 깔린다. 전쟁영화로써가 아니라 그냥 영화적으로 밸런스를 깨버리는 연출. 의도적으로 관객에게 감정이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했다. 감독이 '감정이입으로 당신들도 여기서 편 먹기 하지 말라고'. 다만 생사를 두고 힙합 음악이 켜지는 건 아무래도 낯설긴 하다.
- 워싱턴 시가전,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든다. 기자들이 한 쪽에 기대어 사진 촬영을 진행해나갈 때 이미 그 구도, 그 프레임 자체가 중립을 떠난 건 아닌지, 취지와 의도가 중앙에 있대도 시선 자체가 한 쪽에서 반대쪽을 향하게 되니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립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쩌면 리(커스틴 던스트)의 죽음이 이를 뜻하는 건 아닌지. 알래스카(중립 지역) 협상을 원했던 비서의 죽음도.
- 개인적으로 지역, 세대, 성별 등을 이용해서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라치기(분열) 조장하는 자들만 줄어도 세상은 계속 진보할 거라 믿는다.
 창민쓰
창민쓰
추천인 3
댓글 4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