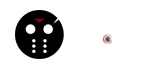태양은 다시 뜬다 (1965) 유현목감독의 농촌드라마. 스포일러 있음.

잘 생기고 인텔리스러운 김진규가 무지렁이 농사꾼으로 나온다.
연기는 물론 아주 잘 하지만, 연기역과는 별개로 잘 안어울린다. (하지만, 김진규스러운 농민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이 영화의 장점은, 당시 농촌공동체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전문직을 선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당시 농민들은 자기 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 김진규는,
농사가 끝나면 곳간에 쌀을 들여놓을 틈도 없이 지주에게 갖다 바친다.
손자가 생기자, 김진규는 자기 땅을 마련해서 손자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소원을 넘어서서
(달성이 불가능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에게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밭이 있다. 아내가 죽자, 그는 아내를 밭에다가 묻는다.
거름이 되라고 말이다. 마을사람들은 김진규를 독하다고 욕하지만, 그것은 아내의 유언이었다.
김진규는 몰래 밭에 나가, 죽은 아내와 궁시렁궁시렁 대화를 나눈다.
그는 아둥바둥 조그만 이익만 있어도 남을 때리고 깨물어서라도 그것을 붙잡는다.
그럼 그는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부유하게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간신히 입에 풀칠한다. 그게 당시 농민의 현실이다.
지금 사람들이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것처럼, 당시 농민들은 한뼘만한 자기 땅을 가꾸고 기름지게
만드는 데 평생을 바친다. 이건 땅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조그만 땅 위에서 평생 일하며 가꾸어 왔다.


어느날 정부에서 측량기사가 와서 마을땅을 측량한다.
댐을 만들어서 저 위에 못쓰는 땅을 농토로 만들겠단다. 하지만 대신 지금 땅은 물속에 잠겨야 한다.
경제적으로 따지자면야, 지금 땅은 물 속에 잠기게 하고, 기름진 저 위의 땅을 더 넓게 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 없다. 하지만, 지금 땅이 어떤 땅인가? 이건 그냥 땅이 아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평생의 땀을 바쳐 온 곳 아닌가? 농민들은 저항한다.


이것은 계몽영화의 일종이다. 김진규는, "조상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니냐?"하면서 고을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한다. 그리고, 이지메를 당한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마을사람들의 이지메를 뿌리치고 댐을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농촌공동체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은, 지금 와서는 불가능한 일이리라.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재미 없는 계몽영화처럼 보이겠지만, 영화는 아주 재미있다.
말린 북어를 다섯마리 먹으면 조그만 땅을 준다는 말에, 억지로 억지로 말린 북어를 먹던 큰 아들은
북어는 북어대로 못먹고 병은 병대로 걸려서 자리보전하고 눕는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땅은 갖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그리고, 요절한다.

김진규에게 마을 지주가 접근한다. 마을 지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댐을 동네에 건설하려 한다. 김진규에게 자기 편을 들어주면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논을 주겠다고 한다. 김진규는 마을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치지만,
지주가 김진규의 손에 땅문서를 쥐어주자 마음이 바뀐다. 김진규의 눈은 이글이글거린다.
농민의 땅을 향한 집념은, 인간의 다른 그 어떤 욕망보다도 강렬하다.
마을에는 댐이 건설된다. 하지만, 댐이 건설되고 동네 농민들이 모여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농민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을 것이다.
농민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견고한 끈을 끊어놓았기 때문이다. 합리성, 경제성, 개인주의같은 것이
농민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 영화는 유현목/김진규가 만들었으니,
완성도와 재미가 아주 높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혁기를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다. 1960년대 농촌근대화기에 그냥
사라지고 파괴되어야 했던 대상이었던 구습 -
농촌의 정신적 풍경 말이다.
추천인 2
댓글 6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2등
2등  3등
3등 그렇습니다. 농촌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히 그린 영화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영화를 만들 당시, 농촌공동체는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