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메뉴-리뷰
 소설가
소설가
힘들게 봤습니다. 현재 상영하는 곳이 한 곳뿐이어서. 짧게 쓰려고 한 건데 길어져 버려 "리뷰"라고 썼습니다만, 평소 제가 적는 리뷰에 비해 조금은 함량 미달일지 모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영화를 보기 전, 아니 보지 않아도 대략의 줄거리가 떠오릅니다. 이미 학습된 몇몇 레퍼런스가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 까닭에 <더 메뉴>가 장르적으로 스릴러로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는, 특히 이토록 쉽게 구분해놓은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르를 정의하는 것은 자율적이라기보다 차용한 것 그대로 안착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를 세계적으로 통용하다 보니 구분법 역시 딱히 반기를 들 일이 없을 만큼 굳어졌습니다.
<더 메뉴>는, 로알드 달의 <맛>에서 착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풍자나 비판, 더 낮잡아 빈정거림이 담긴 문학에 대해 로알드 달은 위대하다고 번역하지만, 어느 정도 오타쿠 문화와 결합해 창작하지 않거나 그러하기에 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로얄드 달이 (마틸다나 찰리의 초콜릿 공장 등으로)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나더> 등으로 최근 다시 유명세를 얻은 아야츠지 유키토의 경우 달의 <맛>을 오마주한 단편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례입니다만, 장르가 아닌 소위 본격문학, 순수문학으로 분류되는 책 10권을 제가 무작위로 골라 내용을 분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약 100권의 책을 "정말 무작위"로 꺼내 본 내용의 70%가 불륜, 또는 섹스가 소재였다는 사실에서 한국소설 소재의 다양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는 글을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 불륜이나 섹스를 하나의 장르라고 하지 않듯이 사르카즘 역시 장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재보다는 넓고 장르보다는 좁아서 특정한 주제이자 계열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길게 적었습니다만, <더 메뉴>는 로알드 달의 <맛>을 발전하고 계승한 사르카즘 계열의 (잔혹한) 드라마라고 해야 적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은 것에 비해, 내용은 좀 밋밋합니다. 특히 <맛>과 파생하거나 비슷한 단편을 여러 편 읽어 보았다면 너무나 평이한 전개와 얇은 비판의 수위 탓에 실망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내용의 개연을 위한 전개가 너무나 개인적인 것, 그러한 탓에 범용적인 즉 일반화까지 오기 어려운 정도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다 해도 감독이 분명하고 명확할 만큼 감각적인 면이 충분합니다. 전개가 침잠할 때마다 등장하는 잔혹함이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즉 전체를 관통하기보다 하나의 장치로 잔혹함을 사용함으로 인해 영화의 격이랄까, 아니라면 영화의 완성도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감점의 요인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르카즘 계열에서도 잔혹함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반대로 듭니다. 뭐든 처음 접하는 소위 "첫경험"은 무섭게 각인되기 마련이잖아요. 크레이그 조벨의 <헌트>에서 베티 길핀의 역할이 각인된 이유도 그래서일 겁니다.
이러한 계열 중에서 대중적인 히트를 친 작품을 꼽으라면, <돈 룩 업>일 겁니다. 여러 영화가 스칩니다만.
어쨌든 <더 메뉴>에서도 사르카즘은 하나의 장치로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화 전체로 보자면, 특정한 사람이 섬에 초대되어 미식을 위한 고가의 디너를 치른다, 라는 로그라인과 사람이 죽는다, 만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메뉴>는 목적성과 상징성이 다분한 현대사회의 이야기를 갇힌 공간에서 축약하고 단순화시켜 빈정거렸다는 데에는 성공입니다. 반면 로알드 달의 이야기에서 분화했다고 하기에는, 감독이 놓치지 않으려 했던 "우아함"이라는 상징성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상징을 위해 더 높고 더 나은 사람들을 "소재"이자 "장치"로 등장시킨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상당히 교차해버린 듯합니다. 안야 테일러 조이가 분한 마고와 니콜라스 홀트가 열연한 타일러가 그들이 소재로 상징하거나 기능하는 장치로 잘 활용된 반면에 "디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은 짚기는 하나 희석되고 타자화되는 "버려지는 조연"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러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압권으로 각인됩니다. 나, 인간, 주연, 조연을 가리지 않고 음식의 장치로 산화시켜 버리는!
결론하면, 아직은 완연하게 도달하지 못한 감독의 중간 도착점 정도가 <더 메뉴>인 듯합니다. 즉 중간 과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론한 이유는 그에게서 미쟝센의 천재인 박찬욱 감독 만큼이나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독인 마크 미로드가 한 단계 업을 할지, 아니라면 그저 그런 감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여물지 않은 주제와 찬사와 비난을 받을 양극이 대립하는 듯한 전개나 설정, 그에 반해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마무리의 화려함은 더할나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맺게 됩니다.
마크 미로드의 넥스트 스텝을 기다리게 만드는, 결과물이지만 과정이었던 영화!
많은 분들보다는 이러한 계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각인이 되지 않을까. 감독의 다음 영화를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추천인 8
댓글 11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미래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2등
2등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날이 추우니 건강 잘 챙기십시오.
"아직은 완연하게 도달하지 못한 감독의 중간 도착점 정도"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과정이라는말-참 표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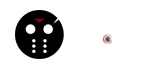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이 감독이 막장 코미디 <못말리는 알리> 감독인 거 알고 경악했어요. 아리 애스터 느낌도 들어서 혹시나 했는데, 작곡가가 <유전> 작곡가고.. B급 코미디 감독이 아리 애스터 영향을 받아 업그레이드 됐나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