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탈리스트>를 보고(스포O)

올해 골든글로브 작품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고, 영국 아카데미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아카데미에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시상식 시즌 가장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브루탈리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브루탈리스트>는 오프닝에서부터 대칭구도와 핸드헬드, 강한 음악의 사용 등으로 미국행을 긴장감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생략하면서도 영화의 사실감과 시대의 공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시작과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확실하게 사로잡습니다. 이 작품은 카메라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관객이 인물에 몰입하기 보다 영화에 거리를 두게해서 텍스테 대해 줄곧 사유케 합니다. 핸드헬드, 역동적인 카메라무빙, 화면이 튀는 점프컷, 배우의 카메라 응시 등으로요.
서막이 지나고 1막에서 건축가인 주인공 ‘라즐로 토스’이 처음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리모델링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손보는 것인데, 어쩐지 이게 ‘라즐로’의 처지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보다 전쟁 이민자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 당장 사촌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 등이 그렇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처음에는 ‘해린슨’에 의해 실패되면서 공사판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는데 이런 위기에서 극복하는 건 ‘라즐로’의 실력,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라즐로‘의 천재성을 알아본 ’해린슨‘이 그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라즐로‘의 ’건축의 정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건축은 주인공인 ’라즐로‘가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자 삶에 대한 방식이며, 전쟁에 대한 반항이라고 표현하니까요.
’해린슨‘이 ’라즐로‘에게 문화센터 건축을 맡기면서 ’라즐로’에게 주요한 업무가 생기는데 이번엔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에서의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것이죠. 이 또한 주인공 ‘라즐로’와 맞닿아있는데 이민자인 그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새로운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과 오버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15분의 인터미션을 두고 1막은 재기에 대한 희망을 잔뜩 가진 채 막을 내리며 15분의 인터미션을 갖습니다. 이때, 1막의 엔딩이 가진 희망으로 하여금 2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인터미션은 단순히 러닝타임이 길어서라기보다 영화를 환기시키고 2막까지의 4~5년 간의 시간 격차를 극 중 체감시간보다 관객의 물리적 시간으로 체감케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그렇게 2막에 접어들면 1막 엔딩의 희망을 빠르게 낙담시킵니다. 영화가 어느 정도 대구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막에서는 ’라즐로‘가 이민 온 것처럼 2막에선 그의 아내 ’엘리자벳‘과 그의 조카 ’조피아‘가 이민을 오고, 얼핏 미국에서 적응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구두닦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하고, 1막에서 리모델링 사업에서 쫓겨난 것처럼 2막에서는 열차 사고로 문화센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이 그렇죠. 이런 1막과 2막의 대구법을 통해 영화에 운율감을 주고 밀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2막의 이야기 전개나 부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영화의 핵심은 바로 아름다움의 본질이 바로 추악함에 있다는 겁니다. 2막에서 ‘라즐로’와 ‘해린슨’이 대리석 자재를 보러갔다가 전쟁 비화를 듣는 에피소드도 단순히 에피소드로만 기능하지 않고 영화의 텍스트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각본이 짜여있기도 합니다. ‘해린슨’은 사실상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에 대한 은유라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1막에서 ‘라즐로’와의 대화에서 가족의 뿌리를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라는 아이러니가 있죠. ‘라즐로’에게 기회를 주지만 금방이라도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손을 떼는 기회주의자같은 모습도 기회의 땅이라고 포장되어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은 아메리칸 드림처럼요. 그런 접근에서 보면 2막 후반부에 들어나는 강간이나 ‘엘리자벳’의 폭로를 통해서도 이 영화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애티듀드를 읽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2막에서 ‘라즐로’가 자신의 급여를 반납하는 등 무리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동기는 캐릭터의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 공사의 지향점이 단순히 건축도 아니고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네 개의 건물을 하나로 연결시키려 하는 건 결국 이민자로서의 자신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흡수되어 사회와 연결되길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나아가 에필로그까지 보면 건축사조와 건축물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재현하고 치유하는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요. 더불어 1막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라즐로’는 나치를 피해 이민갔지만 여전히 유럽엔 그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에필로그에서도 볼 수 있듯 현대까지 ‘라즐로’의 건축물은 남아 나치에 저항하며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긴 여운을 주네요.
- 별점 : ★★★★★
추천인 8
댓글 12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2등
2등 
 3등
3등 나중에 재관람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리뷰 잘 읽었습니다 ㅎㅎ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리모델링과 신축 간의 비교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미국의 아이러니'란 지점이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라즐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미국을 보여주는건가 싶었습니다. 기존의 미국 또한 이주로 시작하였으나 정주로 고착화된 것 처럼 라즐로라는 작은 미국이 이주에서 정주로 마감하는 듯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틸라 치하는 마치 영국 식민지기, 필라델피아에서 석탄캐는 시기는 독립선언으로 알레고리를 엮어보고 싶지만 미국 역사에 대해선 이것이 아는 전부네요..^^ 마약이나 매춘과도 알레고리를 엮어보고 싶었는데 제 자신에게 좀 아쉬워요..ㅠㅠ
저는 라즐로 부부와 조피아가 다음 행선지를 선택하기 위해 식탁에 모인 장면에서 라즐로 부부는 계속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오니즘으로 흘러가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도 보았고, 부조리한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 같이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댓글이 좀 길어졌지만, 써주신 글이 저에게 머물러있던 감상점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ㅎㅎ 양해 바랍니다.
뭔가 이 영화는 말할 부분이 많아서 러닝타임만큼이나 이 영화를 놓고 논하는 시간도 길켄데 이렇게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양해라뇨.. 언제든 환영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젺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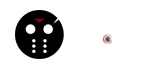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주인공 서사와 건축물이 같은 맥락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