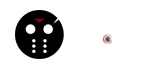블로우업 (1966) 걸작. 지알로의 예술영화화. 스포일러 있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감독의 블로우업은 참 인상적인 영화다.
김기덕감독의 영화를 많이 연상시켰다. 거칠고 직설적인 힘이 있다. 김기덕감독의 영화처럼,
상징을 세련되고 복잡하게 영화 안에 녹여넣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생경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직구의 속도로 묵직하게 던져온다.
표면적으로는 패션사진가인 주인공 토머스가 영국 거리를 롤스로이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겪는 일상들을 그린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들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처음 나가서 어느 골동품상점에 가서 골동품을 사려 한다. 하지만 골동품상 주인은 이상하게도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게는 팔지 않겠다고 한다. 주인공을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인공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패션모델들의 사진을 찍는다.
주인공은 나가서 공원으로 간다. 거기에서 살인사건을 사진으로 찍게 된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나간다. 이번에는 유명록가수들의 콘서트에 간다. 록가수가 부셔서 내던진
기타의 조각을 가지려고 수많은 팬들과 싸운다. 하지만, 그렇게 악을 써서 간신히 얻은
기타조각을, 거리에 나와 혼자가 되자 던져 버린다.
이렇게 사건을 하나의 연속이 아니라 조각 조각낸 다음,각 사건을 상징으로 바꿔 버린다. 주인공의 삶이
어떤 연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분절되고 고립된 순간들의 집합같은 것이라 이야기하려는가?




그것이 상당히 재미있다. 주인공 토머스의 현대적인 욕망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같은 생각이 든다.
토머스는 성공한 패션사진작가다. 하지만, 그는 불만이다. 그는 다큐멘터리사진작가가 되고 싶다.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노동자로 가장하고 공장에 들어간 토머스로부터 영화가 시작한다.
하지만 공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자마자, 토머스는 롤스로이스에 오른다.
그리고 화려한 패션모델들이 있는 자기 스튜디오로 간다.
그는 영화를 통해, 하나의 욕망에서 다른 욕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욕망으로 건너간다.


토머스는, 화려한 패션모델들을 비인간적인 개체취급한다. 그는 자기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패션모델들로 하여금 자기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다그쳐 나간다.
패션모델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위협을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패션모델들은 토머스의 욕망의 희생자인가?
영화 나중에 보면, 패션모델들도 자기 나름의 욕망에 충실하다.
이런 욕망의 네트워크, 거미줄이 현대사회란 말을 하고 싶은 듯하다.
그는 사진을 찍다가 중단하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런던 시내로 나간다.
그는 차를 갑자기 멈추고 우연히 본 골동품점으로 들어간다. 관심도 없던 옛날 조각을 사겠다고 주인에게 말한다.
주인은 처음 보는 토머스를 노려보며, 물건은 이미 팔렸다고 말한다.
토머스는 이번에는 옛그림을 보며 이것을 사겠다고 한다. 주인은 그 그림도 이미 팔렸다고 한다.
토머스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다.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그는 화가인 자기 친구에게도 그의 그림을 사겠다고 한다. 친구는 토머스에게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욕망들을 소비할 수 없는 상태 - 그는 그것을 일상으로 겪는다.


약간 거칠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촬영이다.
그는 공원으로 간다. 빈 공원에서 어느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간다.
토머스는 몰래 그들을 쫓으며 사진을 찍는다. 이유는 없다. 그는 관음증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그가 가지는 공허한 욕망 때문일까? 자기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는 욕망 말이다.
그는 자기가 찍은 사진 속에 살인사건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으면 CCTV영상을 확대하면 그만이다.
그는 사진의 부분을 확대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또 확대사진으로 찍고 해서
현미경적인 클로즈업을 만들어낸다. 그는 두 남녀의 뒤 풀숲에서 총을 들고 겨냥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이 영화는 지알로의 영향을 받아 만들었으며, 또 향후 지알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추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거나 혹은 범인의 추격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 전체를 통해, 그는 사진의 부분을 확대하고 더 확대하고 이것을 반복한다.
이것이 이 영화의 전체 사건이다. 그의 강박관념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주제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여자가 주인공을 찾아온다. 제발 사진을 돌려달라고 애원한다.
주인공은 그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사진의 댓가로 그녀와 섹*를 요구한다. 여자가 옷을 벗자,
주인공은 관심이 없어져서 여자에게 가짜 사진을 주어 돌려보낸다.
그는 사진들을 계속 확대해나가며, 그 확대된 사진들을 벽에 붙여 놓는다. 벽이 사진으로 가득찬다.
점점 더 확대되어가며, 흐릿한 그림자의 덩어리가 되어간다. 이제는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래도, 그는 더 확대해간다.
이게 이 영화다. 사건의 전개도 진전도 없다.
여자는 영화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 중요 용의자로 주인공이 계속 만나지도 않는다.
어느날 주인공이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사진들 필름은 모두 누가 가져가 버렸다. 모두 사라졌다.
주인공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간다. 공원에도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
주인공이 뭘 해보려고 해도, 증거도 단서도 없다.







주인공은 망연자실해서 공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한 그룹의 어릿광대들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테니스장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배드민턴을 치는 것처럼 판토마임들을 한다.
그러더니, 어느 어릿광대가 테니스장 바깥으로 배드민턴공이 떨어졌다고 집어달라고 한다.
주인공은 피식 웃더니, 있지도 않은 배드민턴공을 집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척 한다.
같이 놀아주자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뒤돌아서는 주인공 뒤에서 배드민턴공이 통 통 튀기는 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은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음장면에서 주인공은 사라져 버렸다.
전혀 지알로스럽지 않은 결말이다. 주인공이 갑자기 스르르 없어져 버리는 추리영화 결말이라니.
그 거칠고 직설적인 힘이나,
멀리 돌아가지 않고 온힘을 다한 직구로 던져오는 듯한
어프로치가 김기덕감독의 영화를 많이 생각나게 한다.
세련되기보다는 야성적이고 직설적인 상징의 힘에 많이 의존한다.
뭐, 영화 대부분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감독은 자기 상상을 주저없이 화면에 풀어놓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이미지에 비상한 힘이 있다.
관객들을 욕망의 원더랜드에 몰아넣고 당혹해 하며 사색하도록 만든다.
일상을 상징으로 바꾸어 버린다.
살인사건이 있지만, 전개도 추리의 진전도 없다.
주인공은 계속 사진을 블로우업해서 보이지도 않는 흐릿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몸을 바쳐까지 사진을 되찾아가려던 여자는 그냥 단서도 없이 사라졌고,
필름도 사진도 사라져서 누가 가져갔는지 절대 알 길 없다.
이 영화에는 추리도 사건도 없다. 오직 욕망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 후반 그 사이키델릭한 분위기, 뭔가 열에 들뜬 듯하고 사회 전체가 실험적인 듯한 분위기를 잘 잡아냈다.
록가수가 공연을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자, 앰프를 기타로 막 두들기는 장면,
그리고 화가 안 풀려 기타를 바닥에 두드려 박살내는 장면 등도
당시 분위기를 잘 포착해내는 것 같아 좋았다.
참 재미있게 보았다. 향후 지알로영화들이 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추천인 4
댓글 4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