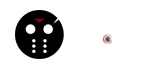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씨너스: 죄인들> 라이언 쿠글러 감독, “음악은 인간의 전체를 말하죠. 악당 렘믹은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카란
카란

<씨너스: 죄인들>은 뱀파이어 호러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1930년대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블루스와 아일랜드 민속음악을 통해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인간성과 정체성을 조명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마이클 B. 조던이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을 연기하며, 잭 오코넬이 뱀파이어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렘믹 역을 맡았다. 감독 라이언 쿠글러는 이번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ㅡ 이번 작품에서 블루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블루스는 인간성 전체를 긍정하는 음악이에요. 교회 음악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블루스는 몸과 영혼 모두를 위한 거죠. 욕망과 분노, 성적인 갈망까지, 인간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는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잘라내지만, 블루스는 다 안고 갑니다. “난 나쁜 놈이야. 이 여자가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인간이에요.
블루스를 들을 수 있는 주크 조인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들판에서는 섹시해지기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하죠. 그건 저항이자 해방이고, 동시에 삶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행위에요.
ㅡ 뱀파이어 집단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이 영화는 이제 관객의 것이에요. 4월 18일 이후로는 저나 제 아내 진지(제작자), 세브 오하니안(제작자)의 것이 아니죠. 어떤 해석이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렘믹이라는 악당을 쓰면서 느낀 감정은 이전에 킬몽거를 쓸 때와도 달랐어요. 이 캐릭터는 정말 사랑하면서 썼습니다. 잭 오코넬이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도 정말 감동이었고요. 저는 이 캐릭터가 '마스터 뱀파이어'이기를 바랐어요. 보통은 이미 형성된 무리가 등장하는데, 저는 리더 한 명을 먼저 보여주고, 점차 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죠.
렘믹이 처음에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구조가 너무 강렬했어요. 그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인물이에요. 그 지점에서 굉장히 흥분됐어요. 아직 그런 뱀파이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ㅡ 영화에서 두 개의 음악 쇼케이스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주크 조인트(미국 남동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운영하던 음악, 춤, 도박, 음주를 특징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시설) 장면과 뱀파이어의 아이리시 음악 장면이죠.
저도 그 장면들을 가장 좋아해요. 영화 전체가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죠. 이들은 제국주의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음악은 금기였어요.
아일랜드 스텝댄스는 일종의 저항이었고,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딱딱한 자세'가 생긴 거예요. 렘믹이 1932년 클락스데일(미시시피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울릴 사람들을 찾는 거죠. 토요일 밤을 누구와 보낼지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은 냉소적인 시대예요. 모두가 이미 모든 걸 본 것처럼 느끼죠. 저는 관객에게 90년대 초반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공룡이 지프 옆에 서 있던 순간처럼, 그런 마법을 주고 싶었어요.
ㅡ 주크 조인트 장면은 롱테이크로 촬영됐고, 시간의 흐름을 넘나드는 느낌이 인상 깊습니다. 이런 연출을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요?
각본 작업 때부터 염두에 뒀어요. 뱀파이어 설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초자연적 요소들도 필요했죠.
우리 모두 한 번쯤 압도적인 공연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연주를 끝냈을 때, ‘진짜 미쳤다’, ‘끝장났다’고 외치며 환호하죠. 그 감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제 일은 영화라는 언어로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1930년대에 주크 조인트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보지 못한 세대였고, 음악이 맞으면 손자들과도 함께 춤출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게 꿈이자 현실이었죠.
ㅡ 후반부에는 뱀파이어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아이리시 음악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아이리시 음악에는 늘 숨겨진 이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Rocky Road to Dublin’(아일랜드 민요)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에너지 넘치게 불러요. 괴물과 싸우는 듯한 이야기조차도 힘차고 경쾌하게 담겨 있죠.
아이리시 민속음악도 델타 블루스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낸 예술이에요. 흙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흙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슬퍼도 우리는 춤을 춰요. 울지 않아도 노래로 저항하죠.
영국이 듣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가사를 숨기죠. 렘믹은 이들과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이 겪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정말 흥분됐어요. 그게 영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