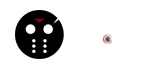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스포) <멘> 심층 해석 & 리뷰
 따마
따마

약 한 달 전쯤, <멘>을 CAV 기획전으로 보고나서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뒤늦게나마 해석 리뷰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비교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비유하기에 얼른 이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난해하다고 느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구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석하다가 이렇게 정리 해보게 됐습니다.
삽입곡인 Lesley Duncan의 Love song을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1. 제목 '멘(Men)'과 '로리 키니어'의 1인 9역

가랜드 감독이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멘>은 남성성의 관습, 속성,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하퍼', 자살한 남편, 그의 동성 친구, 마을 사람들로 나뉘는데 하퍼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성 역할은(마을사람들)은 배우 '로리 키니어'가 1인 9역으로 연기했습니다. 1인 9역 캐스팅은 단순한 연기력 자랑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남성성과 그 속에서 발현되는 폭력 등, 그 본질은 결국 다르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장치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멘>이라는 제목 또한 남성 각 개인이 각자마다의 (말도 안 되는)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다 같은 '남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똑같은 폭력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후반부에서도 남자들의 신체가 점차 훼손되며 결국 남편이 자살한 모습과 같아지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2. 나체의 부랑자

나체로 돌아다니는 이 부랑자의 정체는 '그린맨'입니다.
가랜드 감독이 <멘>의 모티브를 얻은 유럽 설화 속의 '그린맨'은 숲의 정령 같은 존재로 부활이나 탄생, 새로운 성장의 순환을 상징하며 얼굴이나 입, 콧구멍 등에서 나뭇잎이나 덩굴이 돋아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교회나 벽화 등 많은 건축물들에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며 하퍼가 교회에서 마주했던 비석에도 그린맨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비석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서치를 하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일대에서 사우스파크의 한 국도 근처 폐터널 인근을 걷다 보면 '그린맨'이라고 불리는 얼굴 없는 남자가 나타나 희생자의 얼굴을 빼앗아 간다는 괴담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린맨의 정체는 어렸을 적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얼굴과 팔 한쪽을 잃게 된 '레이먼드 로빈슨'이라는 남성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을 싫어해서 혼자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 주로 인적이 없는 밤에만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했다고 하는데 운전중에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띠는 것을 보고 '그린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상 때문에 붉어진 얼굴이 노란 전조등에 비춰 녹색으로 보였음)
관련 기사: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1809231037088413141_1
터널에서 출몰했다는 점에서 영화 속 그린맨과 유사성이 있는데 모티브일지 우연일지 모르지만 신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3. 사과

많이들 이해하셨겠지만 <멘>에서의 사과는 성경속 선악과와 같은 의미로 하퍼의 내면에 있는 원죄와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첫 날, 하퍼가 숙소에 도착해 사과를 따 먹은 뒤 듣게 되는 집주인 '제프리'의 기분나쁜 농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남편, 집주인, 목사, 경찰관 등의 남자들에 의해 하퍼의 무의식에 심어진 죄책감이 점점 커지게 되어 영화의 종반부에 이르러서는 수십개의 사과가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4. 교회의 비석


▲그린맨과 실라나히그
하퍼가 교회에서 마주한 비석에는 앞 뒤로 다른 모양이 새겨져있는데 한 쪽은 '그린맨' 조각으로 위에 서술했듯이 생명과 부활, 탄생등을 상징하는 조각입니다.
그 반댓편은 '실라나히그'인데 (실라나기그 또는 실라나긱으로도 불림) 과장되게 여성의 음부를 드러낸 조형물로 주로 아일랜드나 영국의 교회와 성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라나히그'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크게 2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교회에 주로 조각된 것으로 보아, 여성의 잘못된 욕망과 영적 타락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기독교 이전 시대 다산과 여신숭배 종교의 유산이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실라나기그 상은 가슴이 평평하거나 노인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다산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실라나히그
그 의미와 유래는 짐작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린맨' 조각의 근엄하고 점잖아 보이는 모습과 비교적으로
'실라나히그'는 우스꽝스럽거나 외설스러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둘 다 같은 생명과 탄생의 상징이라고 간주 했을 때 결과물을 놓고 보면 그것을 다뤘던 창작인들의 태도와 그 무게감에서 적지않은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사실 생명의 잉태와 탄생에 요구되는 헌신과 희생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남성적인 '그린맨'이 탄생과 생명의 상징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이는 고대부터 내려온 문화와 건축양식마저 남성주의적 시각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와 같은 맥락의 장면이 바로 영화 속의 '그린맨'이 입으로 분 민들레 씨가 하퍼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때의 민들레 씨는 '정자'를 의미하지만 이후에 임신하게 되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하퍼가 아니라 '남자들'입니다. 하퍼는 영화 속에서 남성성과 폭력에 저항하며 점차 강해지는 인물이기에 아마 종국엔 남성에 의한 압력에 순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 엔딩
그로테스크한 장면의 향연이 이어지는 최후반부에서 의문의 남자들은 임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건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 즉 폭력의 재생산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끝없는 출산의 마지막에는 하퍼의 트라우마의 시작이자 근원인 남편이 나타납니다.
집주인 제프리에게 "말러(남편의 성) 부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퍼는 이미 죽은 남편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퍼가 "나에게 원하는게 뭐야"라 묻고 남편은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행위도 하퍼에게는 폭력이며 자신을 의심하고, 협박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던 남편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대답을 들은 하퍼는 들고있던 도끼를 어루만집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밝고나서야 하퍼의 친구가 도착했고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폭력의 재생산을 반복했던 남성의 임신과 출산(자연의 섭리를 거역)이라는 기이한 남성주의적 구조에서 벗어나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여성의 임신(섭리적으로 정상)을 보여주며 숭고한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뒤이어 하퍼가 띄고있는 옅은 미소도 결국 남성의 강요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트라우마를 이겨냈다는 긍정적인 결말로 보이네요.
+ Love song
영화의 오프닝에는 Lesley duncan의 'Love song'이 삽입되었고 엔딩에는 커버곡인 Elton John의 'Love song'이 삽입되었습니다. 영화와도 잘 어울리고 듣기만 해도 좋은 곡이지만 가사에도 영화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래는 가사 중 일부입니다.
Until you give your love
there's nothing more that we can do
Love is the opening door
Love is what we came here for
당신의 사랑을 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어요
사랑은 문을 여는거에요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에요
첫 두 줄은 하퍼를 향해 사랑을 요구하던 남편 제임스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줄에선 '문을 여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화 속에서 남자들은 집에 침입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고 반대로 하퍼는 그들을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마지막 줄은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라는 가사인데
하퍼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휴가를 온 이유는 남편의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살이 하퍼의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게 되네요.
마치며
다소 난해한 내용과 기괴한 엔딩 덕분에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것 같지만 싱그러운 녹색의 영상미 + 배우들의 연기력 + 메타포 + 영리한 사운드 활용(터널씬) 등의 요소들이 저에게는 다방면으로 고루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운을 남기면서도 해석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영화 <멘>이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열심히 작성해 봤는데 작품 이해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따마
따마
추천인 13
댓글 11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저는 <멘>의 상징과 은유같은 것들이 (전하려는 내용에 비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기괴해야했는지, 부랑자를 굳이 여러번 등장시켜야했는지, 로리 키니어의 배역은 굳이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등등..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 대대로 내려온 남성성의 폭력과 억압에 대해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것 같아서 참신하고 필요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들레 씨앗, 초반부의 터널, 마지막 끝없는 출산 씬 등등이 이어지는 느낌도 좋았구요.
호불호는 있지만 항상 기대되는 감독의 반열에 들어온 것 같아서 다음 작품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사전 지식 없이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든 영화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