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티파이튼과 성배' 초간단 리뷰

1. 처음에는 '제4의 벽'이 뭔지도 몰랐다. 이 단어를 처음 의식한 게 '데드풀'이었으니 정말 최근에 알게 된 단어다. 다만 그것을 체감한 것은 아주 오래전이다. 장 뤽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를 보면서 스크린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었다. 다만 그것을 '제4의 벽'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제4의 벽'은 나에게 아주 옅은 개념이 돼버렸다. 그것은 마치 이탈리아인이 만든 알리오올리오에 들어간 마늘처럼 '향만 내는' 수준이었다. '네 멋대로 해라'나 '데드풀'이 알리오올리오라면 테리 길리엄의 '몬티파이튼의 성배'는 아주 제대로 만든 마늘장아찌다. 이 영화는 태생부터 '제4의 벽'을 부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듯 하다.
2. '몬티파이튼의 성배'의 스토리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뭐 하나 제정신인 구석이 없다. 대단한 의도를 가진 듯 하지만 의도도 없이 일단 '제4의 벽'을 부수는데 집중한다. 그랬다. 이 영화는 91분 내내 '제4의 벽'만 부수다 끝나는 영화다. 평소 정신 나간 영화를 좋아하는 나라면 당연히 이 영화를 좋아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특히 테리 길리엄의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화가 재미있어야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재미가 없다. 이 글은 "왜 '몬티파이튼의 성배'가 노잼인가"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3. 이렇게 작정하고 '제4의 벽'을 부수는 영화는 1975년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이었을 것이다.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는 1959년에 만들어졌고 누벨바그는 이 시기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고전영화의 형식을 파괴한 대표적 문화운동인 만큼 이 시기의 영화들은 파격적인 형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뉴저먼 시네마나 아메리칸 뉴 시네마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고전이 돼버린 영화사의 대표적인 사조(思潮)지만 당시에는 파격 그 자체였다. '몬티파이튼의 성배'는 그 파격에서 더 나가 거의 '깽판'을 쳐댄다. 농담처럼 내던지는 이 장난질은 영화에 대한 무게감조차 뒤집어버릴 정도로 신랄하다.
4. '깽판'을 좋아하는 나지만 테리 길리엄의 이 깽판은 재미가 없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이미 45년전 깽판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다르와 트뤼포조차 영화 역사의 고전이 돼버렸고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기수들은 대부분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다. 파격은 원래 유통기한이 짧다. '몬티파이튼의 성배'는 분명 파격적인 영화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울 영화는 결코 아니다. 45년전의 센세이션은 흔히 '복고'라고 부른다. 이미 나는 '데드풀'이라는 우아한 파격을 만났다. 그리고 45년동안 영화는 늘 새로운 파격을 맞이하며 진화했다.
5. 그럼에도 나는 테리 길리엄의 영화를 좋아한다. 정확히는 '브라질' 이후의 영화들이다. '그림형제: 마르바덴 숲의 전설'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기이한 이야기를 써내는 그는 70이 넘은 노인임에도 여전히 소년같다(최근작인 '돈키호테를 죽인 사나이'는 그의 자전적 이야기처럼 보일 지경이다. 테리 길리엄은 살아있는 돈키호테다). '몬티파이튼의 성배'는 망상하는 소년의 성장과정과 같은 영화다. 충분히 가치있고 의미있는 영화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재미는 없다.
추천인 7
댓글 7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2등
2등 저도 말로만 듣던 전설의 코미디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막상 별 재미없더군요.
"파격은 원래 유통기한이 짧다"에 공감합니다.
 3등
3등 돈 키호테 관련 변주를 한 영화들이나 <브라질>같은 작품들은 잘맞는데.. <몬티 파이튼>은 진입장벽이 생기더군요 ㅠㅠ 저도 몇장면 보다가 잘 안웃게되어서 안보고있습니다 ㅠㅠ

70년대 코미디에 취향 저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겐 제 인생 최고의 병맛 영화 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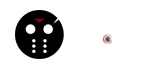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몬티파이튼 영화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도 한번 보세요. 좀 더 세련되게 막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