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평론가의 '님포매니악' 생각
1.잘 알려져 있듯 '님포매니악'은 그 자신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던 라스 폰 트리에의 '우울증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앞의 두 작품은 '안티크라이스트'와 '멜랑콜리아'입니다.)
이 3부작은 병리학적으로도 흥미롭게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제게 '님포매니악'은 특히
'안티크라이스트'와 매우 흡사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소재를 달리해서 같은 내용을
두번 영화화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돕니다.
2.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3.
'우울증 3부작'은 모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3편 모두에 나옵니다)
사실 이 세 편의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 캐릭터는 특정한 사건을 겪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인물
들이라기보다는 폰 트리에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편의 영화에서 여자는 위악적이고 남자는 위선적입니다. 또한 여자는 늘 체험하
고 남자는 늘 해석하죠. 여자는 즉흥적이고 광적이며 위악적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수수께끼
자체를 혼돈의 영역 속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보수적이며 위선적인 동시에
세계를 일종의 틀과 질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님포매니악'은 매우 관
념적인 영화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 뿐만 아니라 많은 모티브나 의미소를 대립항으로 놓았는
데, 영화의 구조나 인물 구도 자체가 이분법적이기도 하지요. (이후 이 글에서 쓰게 되는 '여
성성'과 '남성성'이라는 말은 라스 폰 트리에가 파악하는 '어떤' 범주나 성향을 요약하는 말일
텐데, 일반적인 용례와는 상당히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님포매니악'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인물의 심리적 궤적이나 이야기의 개연
성에 따라서만 이 영화를 보려하면 곤란해질 겁니다.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단순히 "모든
남자는 결국 늑대"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도!) 아닙니다. 샐리그먼을 놀림감으로 삼는다고 해
서 "예술작품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 해석하지 마"라고 내쏘려는 작품인 것도 아닙니
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의 긴 이야기가단지 여성의 자각을 다룬 성적 오딧세이
인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제게 '님포매니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라스 폰 트리에 자신의 '아니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편을 다 보고나서 강하
게 느껴지는 것은 이 영화에서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어떤 성향이나 세계관에 대한 몰두가
창작자이자 남성인 라스 폰 트리에가 겪은 자기부정의 미학적 귀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몇년간 폰 트리에는 스스로가 생각해낸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
'님포매니악'은 자기분열적입니다. 말하자면 이야기 속에서 조롱의 뉘앙스로 다루고 있는 것들
을 (역설적이게도!) 형식적으로는 집착에 가깝게 애용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자기분열성은
이 영화의 전편을 통해 미학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롱으로 보입니다. 마치 환자의 비밀스러운 체험담을 의사가 청취하는 듯한
상황은 액자 구조의 플롯 뿐만 아니라 쇼트 안의 두 인물 구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 틀 속
에서 정신분석학을 대변하는 듯한 샐리그먼은 신랄한 블랙 유머의 대상으로 내내 묘사되고 있
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님포매니악'은 프로이트와 융의 자장권 내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
니다.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의 자기모순은 '님포매니악'을 한편으로는 신비롭게 보이게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게 여겨지게도 합니다. 제게 이
모든 흥미로운 결과물은 라스 폰 트리에 라는 카오스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님포매니악'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의 (쉽사리 범주의 그물로 건져올릴 수 없는) 개별성과 특
수성을 적극 옹호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는 화술은 철저히
관념적인 범주화에 기대고 있기도 합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법
에서도 그러한데, 일례로 조가 섹스할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의 알파벳으로만 지칭됩니
다. 그리고 극중 그녀가 섹스할 수 없는 네 남자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어 있죠. 사랑이나 가족
애와 단단히 결부시킨 채 섹스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성적 세계를 거부하는 조는
소통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만 흔쾌히 섹스를 합니다. (제롬은 첫 등장 때 J로 지칭되
다가 조가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제롬으로 불려집니다.) 말하자면 조는 섹스에서 감정을 철
저히 발라내는데, 그건 부르주아적 가치 체계 속에서 감정이 특정한 방식으로 섹스와 결합되
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세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둘로 나뉘어진 이 영화는 '
볼륨 1'에 5개의 챕터, '볼륨 2'에 3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5+3이라는 챕터들의 결합 방식은 3+5로 드러나는 이 영화 속 피보나치 수열에 역행하는데,
말하자면 이와 같은 역피보나치 구조가 시도된 것은 조가 피보나치 수열로 상징되는 질서정연
한 세계에 난폭하게 대응하는 '마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들은 수없이 제시할 수 있을 겁
니다.)
7.말하자면 이 영화의 라스트신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가지 체계 혹은 세계관이 공존할 수
있다고 잠시 믿었던 조의 새로운 희망이 깨어지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이 영화 속에 중요하
게 삽입되어 있는 조의 님포매니악에 대한 설명을 ("색정증은 다양한 섹스 경험의 총합일 뿐")
다른 말로 바꾸어보면 결국 색정증이라는 건 섹스의 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섹스의 폭과 다양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조의 상황과 그녀 경험의 맥
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 보여서 "내 인생 최초의 친구"란 말까지 들었던 샐리그먼은 마지
막 순간 그녀를 범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오해를 드러냅니다.
(언뜻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샐리그먼은 조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제롬과 상당 부분
겹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8.샐리그먼은 그녀가 자신과의 섹스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님포매니악인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섹스의 양일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
부하는 몸짓을 보이자 의아해져서 "수천명의 남자와 잤잖아!(그런데 왜 나랑은 안 자겠다는 거
야)"라고 말함으로써 님포매니아와 그녀와 그녀가 포함된 세계(관)에 대한 (여전히) 철저한 무
지를 드러냅니다. 수천명의 남자와 잤으니 나와도 잘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섹스를 양화하는
견해인 셈이고, 샐리그먼 스스로를 수천명의 다른 남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확언하
는 견해인 셈이며, 조를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도구적이며 일반적인 여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검은 봉오리를 가진 물푸레나무'
같은 여자입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해본다면, 이제 인생 최초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난
남자들과 달랐던) 친구를 잃게 된 조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한 명을 잃게 된다
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전투적인 생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나의 반례를 상실하는 것
이기에 그녀의 절망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추천인 1
댓글 4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친부인줄 알았던 사람이 양부였고 어머니가 바람펴서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 등등.이 영화보면서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 같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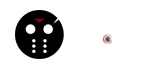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아핳..
개인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랑 '멜랑콜리아'는 라스 폰 트리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름대로 꽤 디테일하게 알 수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은 당췌 해석이 잘 안되던 중이었는데, 이걸 이동진 평론가 말처럼 '우울증 3부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니깐, 본문의 내용처럼 뭔가 착착착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 (눈이 번쩍)
근데 안티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감독이 '정말 여자를 상당히 위악적으로.... '타고난 마녀'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했다가
멜랑콜리아를 보면서는 '생각이 많이 유해졌나? 바뀌었나?' 싶더니만,
님포매니악에서는.......?
뭐 어차피 '딱!' 정리하고 결론을 낼 수 없는 감독 내면이기 때문에 '자기분열적'이 되어버리는 수순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멜랑콜리아 정도의 태도(?) 정리(?)가 마음이 편안~ 해져서 좋았던 거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