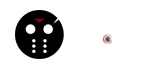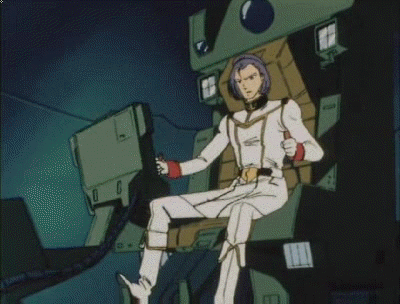아리 애스터 ‘에딩턴‘ 칸 스크린 심사위원 별점표 1.5 / 칸시사회 호불호 뚜렷, 풍자로 시작해 공포로 끝나는 전개, 모두가 납득한 건 아니다
 NeoSun
NeoSun

‘Eddington’ Opens With 1.5 on Screen’s Cannes Jury Grid
칸 영화제 기간 중 크루아제트 거리를 거닐며 해변가 포토콜을 피해 다니고, 에스프레소에 힘입은 비평가들 사이를 지나친 적이 있다면, 스크린 인터내셔널(Screen International)이 매일 공개하는 이상한 격자표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의 이름은 스크린 심사위원 그리드(Screen Jury Grid). 칸 영화제의 오래된 전통 중 하나로, 없어서는 안 될 듯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불안정한 의식을 닮았다.
엄선된 국제 비평가들이 경쟁 부문에 출품된 모든 영화를 관람하고, 각 작품에 최고 별 네 개까지의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는 매일 그리드에 업데이트되어 마치 경마 배당률처럼 인쇄된다. 평론가들의 의견이 쌓이면서 영화들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확히 말해 ‘리뷰’는 아니다. 그보다는 그 순간 영화제의 비평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더 덧없고 미묘한 무언가에 가깝다.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출품된 22편 중 현재까지 단 6편만이 상영됐지만, 벌써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영화제의 '지하실'을 찾은 듯하다. 아리 애스터의 에딩턴은 스크린 심사위원 그리드에서 고작 별점 1.5점을 받으며 충격적인 출발을 했다. 별점만으로 보면, 노골적인 혹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반응에 가깝다.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특히 칸에서는 아침에 야유받은 영화가 저녁에는 걸작으로 칭송받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1.5라는 점수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일종의 신호탄이다. 애스터의 신작이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어떤 이들은 예술과 감정, 땀이 담긴 한 편의 영화를 단순히 별점으로 환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그리드가 불완전한 방식으로나마 포착해내는 것은, 바로 칸이라는 영화제의 심장 박동을 구성하는 그 짜릿한 의견 충돌의 소리다. 이 그리드는 황금종려상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다행히도), 비평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종종 해낸다.
어떤 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또 어떤 해에는 '거장'이라 불리던 감독이 바닥까지 추락한다.
이 그리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영화는 살아 있고, 비평도 마찬가지라고.

https://www.worldofreel.com/blog/2025/5/17/eddington-opens-with-14-on-screens-cannes-jury-grid
Ari Aster’s ‘Eddington’ POLARIZES; Starts as Satire, Ends in Horror — Not Everyone’s Buying It [Cannes]
글쎄, 에딩턴은 확실히 하나의 ‘경험’이다. 칸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극과 극이다. 인디와이어, 버라이어티, 콜라이더, 데드라인은 극찬을 보내고 있고, 헐리우드 리포터, 파이낸셜 타임스, 더 스탠더드, 더 랩, 스크린, 더 타임스 등은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이 혼돈의 한가운데쯤에 있다.
에딩턴은 비웃음으로 시작해 주먹을 꽉 쥔 채로 끝난다. 이 영화는 최근 미국사의 부조리함을 빈틈없이 찔러대며 시작하지만, 결국 그 빈틈들이 열어버린 심연을 응시하게 만든다.
이건 아리 애스터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직설적인 영화다. 유전, 미드소마, 보 이즈 어프레이드 같은 전작들에서 보였던 초현실성은 없다.
문제는 호아킨 피닉스가 주인공으로 심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경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우리는 미국식 카우보이이자 반영웅의 계보를 잇는 인물, 보안관 조 크로스(호아킨 피닉스)를 만나게 된다. 그 반대편에는 테드 가르시아 시장(페드로 파스칼)이 있다. 말끔하고 침착하며,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관료다. 어느 날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충돌 이후, 조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영화는 이 상황을 출발점 삼는다. 코로나 시대의 한 지방 선거는 곧 더 어둡고 혼란스러운 무언가로 변해간다.
처음엔 에딩턴이 익살극처럼 보인다. 미쳐가는 미국을 향한 날카롭고, 때론 부드러운 풍자다. 애스터는 시각적 유머와 부조리 속에서 즐긴다. 10대들이 안젤라 데이비스 인용구로 썸을 타고, 마을 주민들은 별 피해도 없는 시위에 패닉에 빠지며, 온갖 음모론이 퍼져나간다. 엠마 스톤은 점점 현실감각을 잃어가는 조의 아내 루이즈를 연기하며, 인터넷이라는 토끼굴에 빠져든다. 오스틴 버틀러는 쓸모없는 역할로 등장해, 기름기 흐르는 카리스마의 구루가 되어 정신 나간 독백을 심야 텔레마케팅 진행자처럼 늘어놓는다.
영화의 전반부는 그저 미국의 이념적 광기를 관찰하는 데 그친다. 위기감은 거의 없다. 익살극에 가까울 정도다—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
특히 루이즈(스톤)나 가르시아(파스칼)는 인물이라기보다 비유처럼 느껴진다. 파우치, 힐러리 클린턴, 터커 칼슨, ANTIFA 같은 인물과 개념들이 던져지는 방식은 과잉 조리된 느낌이다. 애스터는 모든 것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깊이 있게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다. 야심은 존중하지만, 완성도는 들쭉날쭉하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을 기점으로 확 바뀐다. 선거운동에서 밀리는 조가 가르시아에게 치명적인 혐의를 제기하면서, 판도는 물론 영화 전체가 뒤집힌다. 희극은 비극으로, 풍자는 네오웨스턴이자 정치 스릴러로, 마지막에는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뀐다.
폭력은 갑작스레 터진다. 시위, 부족주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언어들이 갑자기 현실이 된다. 주정부와 원주민 자치구 사이의 경계지대에서 벌어지는 살인은 이 갈등을 더 넓고 오래된 차원으로 재정립한다. 이건 더 이상 보안관과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피의 문제다.
애스터는 영화가 영리함을 버리고 혐오스러움에 뛰어들 때 비로소 자신의 리듬을 찾는다.
그는 항상 부패에 관심이 있었다—가정의, 영적인, 사회적인 부패.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이 과감한 시도를 존중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영화를 감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안전한 이야기와 소독된 감정이 넘치는 요즘 영화계에서, 에딩턴은 뺨을 후려치는 듯한 작품이다.
https://www.worldofreel.com/blog/2025/5/16/eddington-polarizes-cannes-weak-satire-great-action
 NeoSun
NeoSun
추천인 3
댓글 1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