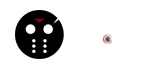작은 신의 아이들 (1986) 아주 특별한 영화. 스포일러 있음.





링컨대통령이 한 말 중에 "신은 평범한 보통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보통사람을 가장 많이 만드셨으니까."가 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신은 열등한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인들이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해주는 신이 작은 신일 뿐이다. 그들은 자기 삶을 행복하게 밝은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두운 음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보통사람보다 이것이 좀 더 힘들 뿐이다.


이 영화는 교사 윌리엄 허트가 장애인학교가 있는 섬마을에 부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청각장애인 새러를 만나 사랑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 영화 주인공인 말리 매틀린은 진짜 청각장애인이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연기 그 이상을 보여준다. 자기를 열어젖혀 보여주는 연기다. 이 영화에서의 연기로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윌리엄 허트는 영화에 흔히 나오는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교사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같은 교사다. 그는 장애인학생들에게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 장애인학교는 윌러엄 허트의 등장으로 큰 (좋은 쪽으로) 변화를 겪는다. 영화 처음만 보면, 클리셰에 가까울 정도로 친숙한 영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 청소부 새러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본론으로 접어든다. 장애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새러는 학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청소부가 되어 여기 남는다. 고집 세고 자기 주관 강하고 명석하다. 늘 외부로부터 자기를 닫고 산다.
말리 매틀린은 이 새러를 아주 매력적이고 신비한 인물로 만든다. 멜로드라마 주인공이다. 그냥 명석하고 고집센 청각장애인이라면 멜로드라마 주인공으로 모자란다. 말리 매틀린이 이 영화에서 만들어낸 새러는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신비하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말리 매틀린은 보여준다. 아주 강력한 매력의 자기장을 자기 주변에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가령, 윌리엄 허트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새러에게 네가 듣는 파도소리를 표현해달라고 하자, 새러는 자기 가슴에 손을 댄다. 보통사람은 파도소리를 귀로 듣는다. 새러는 심장으로 듣는다. 이때 새러의 표정을 보면 관객들은 깨닫게 된다. 새러는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파도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파도소리의 본질을 듣는다. 이 장면의 감동과 신비함은 아주 대단하다.



새러가 무슨 순결한 천사같은 존재는 아니다. 섹*를 무지 많이 하고 다녔다. 나이가 나이이니까. 하지만 사랑은 한번도 한 적 없다. 자기를 내보일 생각도 없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날 이해하리라는 바램 자체가 없으니, 자기가 스스로를 남으로부터 숨긴다.
하지만 새러는 평소에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두고 산다. 사람들은 새러의 굉장한 매력을 모른다. 새러도 굳이 이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진 윌리엄 허트는 새러의 이런 면모를 눈치챈다. 새러도 윌리엄 허트의 이런 개방적인 모습을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윌리엄 허트는 미남이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동거하게 된다. 마을사람들은 보통사람과 장애인 커플에 대해 "얼마나 갈까"하는 회의의 눈초리를 보낸다. 와서 말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윌리엄 허트나 새러 모두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 확고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새러가 자기가 듣는 파도소리를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할 때, 여기에는 과연 황홀과 신비함만 있었을까? 윌리엄 허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했다. 하지만, 이것은 청각장애인인 새러에게는 고통의 몸짓이다. 정상인인 윌리엄 허트는 신비함만 보고 감동했지만, 거기 있는 고통은 보지 못했다. 윌리엄 허트는 결국 새러에게 가 닿지 못했다.
새러에게도 문제가 있다. 윌리엄 허트에게 신비한 아름다운 소녀가 되고 싶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이나 못난 면, 섬세함 등은 숨긴다. 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애인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까? 무섭고 상처 받을까 봐 겁나서 그런 거다. 명석하고 모든것이 분명하고 야무지고 -> 이것도 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기제다. 실제 새러는 정반대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을 윌리엄 허트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새러의 태도는 윌리엄 허트에게는 괴로움을 준다. 새러가 자꾸 자기를 밀쳐내고 무언가 숨기고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윌리엄 허트가 왜 모르겠는가?


결국 둘은 싸우고 만다. 새러는 섬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다.
윌리엄 허트는 곰곰 생각한다. 자기는 정말 새러를 사랑했을까? 좋은 면, 아름다운 면, 신비한 면만 보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 새러라는 사람의 모든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새러에게 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윌리엄 허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자, 자기가 가르쳐온 장애인학생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개방적인 척, 공감적인 척 해왔지만,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고
으쌰으쌰하면 다 잘 해결될 것이라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 허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새러가 과연 그에게 돌아올까? 이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새러는 자기 어머니를 찾아간다. 어머니는 새러에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붙잡아라 하고 말해준다.
진정한 사랑은 인생에 몇번 오지 않는다. 용기가 없어서 이것을 못 붙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 새러는 고통받는 것이 무서워서 용기를 못 냈다. 그녀는 지금까지 소녀였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듯 새러의 인생에서도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다. 사랑을 쫓아가라.
새러의 어머니에게도 새러가 찾아온 것은 뜻밖의 행복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로서 아무리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섬에 틀어박혀 자기를 가두고 속도 비치지 않는 딸이었다.
늘 불행했던 딸이었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하니 더없이 기쁘다.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새러에게 용기를 준다.
새러는 어머니와도 화해를 한다.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두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던 새러는 변한다. 사랑의 힘이다. 그녀는 이제 자기 삶을 한단계 더 상승시키기 위한 성숙을 한다.




그리고, 어느밤, 윌리엄 허트와 새러는 다시 만난다. 새러가 섬으로 윌리엄 허트를 찾아온 것이다.
윌리엄 허트는 새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이 괴로워하여왔다. 그는 그동안 확신했다.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러를 사랑했다. 그는 새러의 고통을 이해했다, 지금이라면 진정한 새러에게 가 닿을 수 있다. 둘은 서로 껴안는다. 둘은 이제 진정으로 서로에게 가 닿는다. 장애인이니 정상인이니 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은 세계에서 그들은 만난다. 이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 둘 다 많이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실한 소통과 이해, 사랑에 이를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고독하고 아픈 이들을 치유한다. 이것이 이 영화의 심오한 주제다. 이 장면의 감동은 대단하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JUMP"라는 노래가 나온다. 둘이 사랑을 통해서 도약하는 순간이다.
말리 매틀린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배우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윌리엄 허트의 섬세한 연기도 아주 좋았다. 이 영화 남주인공은 유쾌하고 쾌활하고 행동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윌리엄 허트는 이 주인공을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연기한다. 그의 이런 어프로치는 영화 후반부에 빛을 발한다. 자기가 새러에 대해 가진 사랑이 진짜였는지, 그녀의 고통에 대해 자기가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뇌하는 후반부 장면에서 윌리엄 허트의 연기는 아주 훌륭하다.
영화는 서정적이고 신비롭다. 멜랑콜리하고 감상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견고하고 묵직하면서도 그 안에서
선명하게 감동을 자아낸다는 뜻이다. 말리 매틀린의 이 영화에서의 연기는 아주 놀랍다. 각본이 토니상을 수상한 걸작 각본이라고 한다. 이 영화가 큰 주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한다. 그래서, 영화의 상징성과 주제의 심오함을 강조한다. 윌리엄 허트와 새러의 두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변사람들도 최소한으로 등장시켜서 영화의 공간성과 현실성을 확보한다. 아주 노련하게 효율적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각본이다. 줄거리는 여분을 깎아낸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지만, 아주 필연적으로 억지 없이 스스로를 전개한다. 그리고, 캐릭터의 매력과 입체감이 아주 대단하다.
영화가 아주 탄탄하다. 비범한 걸작이다. 주제가 대중성이 약간 부족함에도 줄구하고, 당시에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다. 그만큼 영화의 매력과 감동이 대단하다.
** 비슷한 영화로 a patch of blue 라는 1965년작 영화가 있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기, 흑인청년과 장님백인소녀의 사랑이야기다.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형편없어서 장님도 흑인만큼이나 멸시 받았다. 둘 간 사랑은 흑백차별을 비판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을 비판한다. 이 영화도 걸작이다. **
추천인 5
댓글 6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2등
2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