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사쿠의 아내 (1965) 묵직하게 그려나가는 반군국주의. 스포일러 있음.
마스무라 야스조감독의 걸작이다. 사실 요즘 일본영화처럼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는 그런 스타일로 나간다.
하지만 매가리 없는 세밀한 붓으로 그려진 오늘날 영화와 달리
이 영화는 거대한 붓으로 쓱쓱 그려나가는 듯 장엄하고 무겁고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일본고전영화의 장중함에 분노와 반항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
하지만 그 분노가 소재주의로 빠진 것이 문제다.
마스무라 야스조감독이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별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소재가 무슨 "젊은 남자때문에 교수남편을 살해한 아내 (여자는 살인을 후회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레즈비안불륜을 저지르다가 동반자살하려는 아내" "남편을 못으로 찔러 실명시킨 여자" 맨날 이런 거다.
소재를 빼놓고 보면 영화들이 주는 메세지는 아주 크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소재들에서, 관객들이 현실성 및 자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생활성을 찾을 수 있을까?
신문란에서 가쉽기사를 읽는 기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반항이라는 것이 일본영화에서는 피학성을 드러낸다.
하라키리에서 어느 대갓집에서 불관용으로 자기 가족을 죽이자 나이 든 사무라이는 그 집에 쳐들어간다.
뭐 대갓집을 파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의미로 할복자살을 하기 위해 그런 거다.
적극적인 반역 그리고 봉기같은 것은 일본영화에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 파괴같은 것으로 변질된다.
반항적이라는 일본의 누벨바그에 별로 감탄하지 않는 이유다.
대여배우 와카오 아야코의 주연작이다. 카리스마와 열정적인 명연기를 겸비한 여배우다.
마스무라 야스조 감독 영화 주연으로 자주 나와서 이미지가 좀 과격한 감이 있다.
아까 이야기한, 교수남편을 살해하고 뉘우치지 않는 아내, 남편을 못으로 찔러 실명시킨 아내,
레즈비안불륜을 저질러 남의 부부를 죽음으로 내몬 팜므파탈이 모두 와카오 아야코가 연기한 거다.
하지만 이미지와 다르게, 다른 여배우들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그런 적 없이 감독이 하라고 하면 다 했다고 한다.
팜므파탈연기가 자기 성격이 아니라 시키는대로 열심히 한 것이라고 한다.
젊은 여자 오카네는 나이 든 상인의 첩으로 산다.
그런데 남편이 오카네의 집에서 죽는다. 죽은 노인의 아들은 오카네에게 거액을 준다.
일단 거액이 생기자, 그녀는 고향에 가지만, 고향사람들은 왕따시킨다.
돈을 빌려놓고서 야반도주했던 주제에, 첩살이를 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와서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꼽다.
오카네는 '너희들이 날 왕따시키니, 그러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키겠다'하는 마음으로 혼자 고립을 자처한다.
사실 그래봤자 오카네만 손해다.
감독은 폐쇄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전근대적 사회를 비판한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개인의 개성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회는 쉽게 군국주의로 연결된다.
군인이 와서 국가를 위해 나가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 마을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강요하고
여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시킨다.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갔다 오면 마을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칭송한다.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와 군국주의를 상대로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마을사람들은 없다.
다른 삶의 길을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세이사쿠라는 전쟁영웅이 마을로 돌아온다.
그는 존경을 받는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군국주의에 젖어 있다.
국가를 위해 나가서 전사하는 것이 궁극적 애국심을 보여주는 길이라 믿는다.
사실 영화가 사회적인 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도 사회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카네 개인이 나서서 군국주의와 마을의 폐쇄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투쟁한다 하는 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일본영화들과 비슷하게, 이 영화는 오카네 개인의 투쟁으로 나아간다.
오카네 개인의 투쟁이 사회적인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 이 영화의 한계가 있다.
군국주의에 물든 폐쇄된 마을에서 조직적 왕따가 가해지지만, 오카네는 여기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 삶을 산다 하는 것이
군국주의에 대한 반항이자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반전영화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버마의 하프도 그렇고, 이런 개인주의는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후퇴시키는 왜곡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에, 눈으로 보이는 걸작 퀄리티가 있다. 노인의 첩이 된 오카네가 마음을 못 잡고
거리를 배회하는 첫장면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묵직함과 진실성이 느껴진다.
오카네의 비극은 절절하고 그녀의 분노나 절망이 아주 힘차고 묵직하게 그려진다. 일본 고전영화 걸작에서만
보이는 절창이다. 하지만 공감하지는 못하겠다.
추천인 3
댓글 4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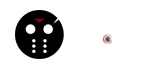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격동의 역사가 담겨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