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데타' 간단 리뷰

1. 영화 유튜버들이 자신의 콘텐츠 제목에 '완벽해석', '총정리'라며 영상을 올리는 걸 보면 조금 같잖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 중 일부는 역사책을 펼쳐놓고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수준의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한 해석'이 많다. 영화를 과하게 해석하는 일은 자칫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참사를 맞이할 수 있다. 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나친 해석은 경계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영화 평론'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책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비디오드롬'(훗날 '박찬욱의 오마주'로 재출간)은 당시 영화평론가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비디오 영화를 기호와 상징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책을 쓴 박찬욱 감독은 프랑스에서 영화공부할 당시에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배웠을 그런 영화보기가 지금은 블로거, 유튜버의 주요 트렌드가 돼버렸다.
2. 영화를 보는 이 같은 방식이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관객이 영화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됐다. 멀뚱멀뚱 앉아서 영화만 보고 돌아서는 일은 메인디쉬를 다 먹고 후식을 먹지 않은 기분이 든다(일단 이건 내가 그렇다). 평론가라는 직업은 영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평론가가 자신의 글을 통해 영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영화의 완성 너머의 새로운 창작이 된다. 관객은 관찰자를 넘어 그 지점까지 영화에 개입하고 싶어한다. 그런 욕구가 오늘날 블로거와 유튜버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나도 그렇다). 이런 관객의 욕구가 사실이라면 폴 버호벤의 영화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의 최신작 '베네데타'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영화에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외로 이런 방식은 그가 전성기 시절 만들었던 몇 개의 SF영화에서도 나타난다.
3. '베네데타'는 16세기 이탈리아 수녀 베네데타 카를리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레즈비언 수녀였던 베네데타(비르지니 에피라)가 어떻게 수녀원에 들어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관객이 개입할 여지는 딱 하나다. '베네데타는 정말로 성흔(聖痕)을 입은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영화는 두 가지 답변의 힌트를 모두 제공한다. 베네데타가 봤을 환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성흔을 조작하는데 사용했을 병조각도 제시한다. 심지어 '예수가 성흔을 조작하라고 시켰다'는 답도 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베네데타는 실존인물이고 영화의 엔딩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 자막에서조차 베네데타의 수녀원이 있었던 이탈리아 페샤에는 흑사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정말로 그녀는 성녀였을까?
4. 영화를 본 관객은 단 하나의 물음을 떠안게 된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나름의 단서와 자신만의 견해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폴 버호벤의 몇 가지 영화에서 등장했던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1990년 영화 '토탈리콜'은 퀘이드(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영웅담이 펼쳐진다. 그러나 그 전에 퀘이드는 '리콜'이라는 기억이식 프로그램(여행사)에 참여했다. 관객은 영화의 결말에 이르러서도 퀘이드의 영웅담이 리콜에서 이식된 기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로보캅'은 윤리적인 물음을 던진다. 인간 머피(피터 웰러)의 기억을 이식받은 로봇은 인간인가, 로봇인가. 이는 인공지능이 고도화 된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대하는 윤리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원초적 본능'은 끝내 범인을 흐리면서 마무리된다. 영화 내내 캐서린(샤론 스톤)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아닐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던진다. 관객은 이 이야기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5. '베네데타'의 물음은 '그녀가 정말 성녀일까?'다. 영화는 끝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던지지 않는다. 영화는 베네데타가 보는 환영을 그대로 재현해내지만, 이는 어딘가 어설프다. 성인이 된 베네데타가 다른 수녀들과 선보이는 연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성흔이 생기게 된 과정도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피묻은 병조각이나 논리적 비약("성흔은 머리에 면류관 자국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상처가 나는 경우)에 의해 성흔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다만 베네데타는 마리아상에 깔려도 다치지 않았고 그녀가 "저 새가 성모"라고 말을 하자 새가 악당에게 똥을 싼다. 그리고 페샤에는 흑사병이 생기지 않았다. 베네데타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일은 신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만약 베네데타가 사기꾼이라면 그녀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교회는 신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무능한 기관이 된다. 반대로 베네데타가 정말 성녀라면 신은 성욕이 가득찬 변태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신이 베네데타에게 성흔을 조작하고 동성을 탐하라고 시켰다면 인간은 죽었다 깨도 신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베네데타'가 던지는 물음은 어느 방향으로 답을 내더라도 교회와 신의 익숙한 관계는 무너진다.
6. 무신론자인 나는 베네데타를 사기꾼으로 해석하는게 맞다. 이는 사기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회는 신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결론과도 연결된다. 사기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신의 섭리는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해도 그는 결국 방관자인 셈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에는 지옥의 사자가 등장하는 현상을 왜곡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라고 말한다. 본래 종교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생겼다. 종교는 '힘들 때 기대는 곳'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신도 인간에게 그 이상으로 관심이 없다. 마치 디즈니플러스 '로키'에 등장한 TVA 요원들 대사처럼 "종말은 대략 수십번 일어났다"는 말과 통한다.
7. 결론: '베네데타'는 '레즈비언 수녀'라는 정체성에 묶여있다. 확실히 이것은 자극적인 발상이다. '레즈비언'은 '수녀'의 반대쪽 끝에 위치하면서 '수녀'의 정체성을 묻는다. 이 물음은 결국 신의 정체성과도 이어진다. 신은 정말로 존재할까? 신은 인간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베네데타'가 제기하는 진짜 물음이다.
추신1) 베네데타 카를리니라는 실존인물의 기록을 모두 찾아보진 않았지만, 16세기 인물인 만큼 기록이 온전히, 상세하게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영화 '베네데타'에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이 영화는 온전히 실화로 볼 게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상당 부분 가미된 이야기다. '베네데타'를 이해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하는 게 좋다.
추신2) 베네데타 카를리니는 종교개혁에 반대한 인물이라고 설명돼있다. 이 점이 어떤 형태로든 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다 뒤져야 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
추신3) '베네데타'는 이탈리아 수녀 베네데타 카를리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도 이탈리아 페시아다. 그러나 이 영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감독은 네덜란드 사람이다. 이탈리아가 배경인 영화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기이한 조합은 프랑스 영화사 SBS프로덕션이 제작해서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기회가 닿는다는 이탈리아어 더빙으로 보고 싶어지는 영화다.
추신4) 폴 버호벤이 세계무대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할리우드 생활을 청산한 뒤였다. '블랙북'과 '엘르', '베네데타' 등 연이어 유럽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면서 명성을 알렸다(이전에 '원초적 본능'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칸 영화제는 평단에서 온갖 욕을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폴 버호벤의 SF영화들은 저평가되는 편이다. 세계 SF영화사에 큰 영향을 준 '토탈리콜'이나 '로보캅'도 매니아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받는 편이고 '스타쉽 트루퍼스'나 '할로우맨'도 그저 그런 영화 취급을 받는다. ...사실 나는 폴 버호벤의 SF영화들을 더 좋아한다.
추천인 17
댓글 4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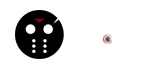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정말 재밌고 알찬 리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