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보는) 영화사] 뤼미에르 이전의 영화들
 靑Blue
靑Blue
들어가기 전에 잡설...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랴, 학교다니랴, 공부하랴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네요. 집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란게 이런 거군요. 다크로드께 참회를...
날씨가 덥습니다. 모두 일사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닭한마리 잡수시면 굿이겠네요.
들어가기 전에...
영화의 탄생은 대게의 경우 뤼미에르 형제가 프랑스의 그랑 카페라는 카페테리아에서 한 사람당 1프랑을 받고 <기차의 도착>(Arrival of Train at La Ciocat Station, 1895)과 <공장의 출구>(workers leaving the Lumiere Factory, 1895)를 상영한 그 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화가 그 순간 '짠'하고 한번의 빅뱅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이전에도 영화에 혹은 시네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왔고, 그 욕구를 실현하다보니 영화라는 매체의 탄생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시네마(cinema)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인류가 예술활동을 시작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라고 부를만한 기술적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인류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영화사를 알아볼 때는 기술적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공부를 합니다. 15세기에는 레오나드로 다 빈치가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e)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의 카메라의 원형이 됩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형 모습입니다. 원래 '카메라 옵스큐라'의 사용용도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이 어떻게 화폭에 들어갈지를 보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지금의 '뷰-파인더'(View-Finder)와 같은 용도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작동 방식이 우리의 눈이 사물을 담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카메라 옵스큐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물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구멍을 통하여 옵스큐라 안에 거꾸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건 눈이 사물을 담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위의 그림을 비교해서 보세요.

그림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카메라의 원형이 눈의 작동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후에 러시아에서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 1896~1954)는 '키노-아이'(kino-eye)라는 사조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러시아 몽타주를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6세기에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가 사진기의 기술적 속성을 지니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진과 영상, 즉 평면에 투영되는 이미지는 모두 현실의 모사한 겁니다. 영화의 역사는 현실의 모사에서 스팩터클을 얻어내려는 시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 16세기 초반
15세기 후반에는 앞에서 보았던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하여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게의 경우 2류작가로,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진가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이건 거의 그림으로 그리는 사진과 다른게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손으로 그린 사진이라는 표현도 아주 어색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아 자세한 기록화가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어떤 발명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을 그대로 태우면 그 조도에 맞추어서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1614년에 이탈리아에서 질산은이 빛에 노출되면 검게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동판에 질산은을 바른 네가티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생각에는 그건 실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나보네요. 그닥 주목을 받지는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동판에 질산은으로 네가티브를 만든 것은 최초의 필름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발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16세기 후반에는 첫 상영기기라 할 수 있는 '마술 환등기'(Magic Lantern)가 나옵니다. 이 마술 환등기는 영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단일적인 이미지를 투영하는게 목적이었던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시의 기술로 연속적인 이미지를 투영하여 운동감을 표현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래의 사진이 '마술 환등기'입니다.

환등기라기보다는 램프에 관이 하나 달린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환등기의 작동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안에서 빛을 비추어서 앞에 있는 필름을 스크린에 투영한다는 점에서 요새 사용하는 필름 영사기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술 환등기'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강의하는데 필요한 시각자료를 보여주는데도 사용되었고, 마치 그림책을 보여주듯 그림을 보여주며 변사가 서술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희의 도구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 것 같긴 합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나 학회발표에 쓰이는가 하면

이런식으로 낯선 세계의 풍경을 서술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 보여지는 사진같은 상황들입니다.

이건 마술 환등기 상영 중에 <허깨비>(Phantasmagoria, 1799 -아! 이건 물론 18세기의 일이긴 해요)라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는 이런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 중에 호러에 대한 갈망이나 관음증 비스무리한 것들이 자리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홍보물 비스무리한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마치 영화홍보 포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죠. 아마도 태초부터 영화의 성향이 대중성을 지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어째 첨부한 사진들이 좀 많아서 안올라갈까 걱정이 되는군요. 나눠서 올려야겠습니다. 뤼미에르 이전의 영화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16세기 후반까지 올리고, 17세기부터는 다시 올리도록하죠.
추천인 4
댓글 8
댓글 쓰기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1등
1등 현재 우리가 영화를 모여서 보는 것에 유래가 이런것이군요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함께 집중되어 있는것에 익숙해져있을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시리즈로 연재해주신다면 행복할것같아요
추천합니다!!
모두 추천을 하여야!
 3등
3등 영화사 얘기하면 지겹게 듣는 기차의 도착!!!ㅋㅋㅋ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간만에 영화사 관련 글을 보니 새록새록하네요~ㅎㅎ

재미있게 잘 읽고 갑니다 ~ ^^
추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셨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D


좋은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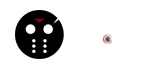













단번에 읽어내려갔네요^^
다음 글 기대할게요